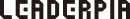김성용의 리더십 에세이 ②
인간 세계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는 거다.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러면 풀릴 거야. 사람도, 세상도, 이 우주도.

‘우리는 추억을 너무 업신여기지 않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것은 추억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세월이 묵혀질수록 자꾸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 학창 시절 들었던 음악이 머리를 지배하고, 지난날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집밥의 음식들이 입맛을 괴롭히고는 한다.
청춘 시절에 내 마음을 빼앗아 갔던 사람이 그리울 때도 있다. 사람이라면 어떤 추억보다 가슴에 남는 추억은 사람 관계에서 발원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맘때가 되면 나에게는 엄마와의 추억이 생각난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두 군데 진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심장과 내분비. 모두 좋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단지 골다공증약을 먹어야 한단다. 세월의 두께만큼 뼈에는 구멍이 송송 열렸는갑다, 싶었다.
휠체어 대신 엄마 손을 꼭 잡고 진료실을 옮겨 다녔다. 엘리베이터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다. 엄마의 손에 힘이 보태진다. 걷는 힘이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발걸음의 폭도 많이 줄었다. 울컥해졌다. 짠하고 가슴이 아팠다.
“엄마, 진료 마치고 남한산성에 가서 닭백숙 먹어요. 울긋불긋한 단풍들도 구경하고요.”
대답 없이 엄마 손은 내 손을 꼭 움켜잡는다. 병원을 나와 차를 몰았다. 남한산성 입구에 들어서자 자동차들이 많아졌다.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다. 가끔 가던 곳이다. 엄마는 기억하고 있었다.
“저번에 왔던 곳이네!”
의자 없이 방바닥에 앉는 것을 힘들어하신다. 두 사람이 먹기에 부담스러운 양이지만 예정대로 닭백숙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다. 나는 살이 많은 닭다리 한쪽을 골라 엄마한테 드렸다. 작은 크기로 살을 발라내더니 조심스럽게 드신다.
엄마 얼굴을 보았다. 울컥했다. 결국 내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말았다. 괜히 헛기침을 했다. 엄마가 나를 쳐다보신다. 목이 메신 듯 물을 찾았다. 31년 전 우리 곁을 떠난 누이 생각이 났다. 누이가 있었다면 엄마의 계절은 훨씬 덜 쓸쓸하고 덜 슬펐을텐데.
이제 엄마의 가을 추억은 몇 번이나 더 만들어질까?
이 글은 2018년 11월 1일에 작성한 글이다. 엄마는 이후 두 번의 가을을 더 만났다. 그나마 그중 한 번은 의식을 빼앗긴 채 병원에 누워서…. 그리고 2021년 1월 엄마는 아버지와 누나를 만나러 하늘 여행을 떠나셨다.
인생이 지나갔다고 지울 수는 없다. 인생의 외양을 지운다 해도 안으로는 소금기가 남아 삶의 간을 맞춰 준다. 삶에서 털어내는 지우개 똥이 새로움을 위한 인생의 꽃씨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나이는 표시도 표식도 없다. 대신 마음속에서 나이테로 그려지지 마련이다.
오래전 아내가 생일선물로 몽블랑 만년필을 준 적이 있다. 늦가을의 생일을 맞은 남편에게 ‘인생 풍경을 이제부터 문신처럼 글로 남기라’는 덕담과 함께였다. 선물을 받아들고 ‘아날로그 같은 삶을 살아볼 거’라며 냅다 소리를 질렀었다.
광속의 세상에서라도 사랑만큼은 아날로그처럼 해야 아름답다. 만년필로 글을 쓰는 횟수만큼 사랑은 깊어지고, 숫자만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A4 한 장을 꺼내놓고 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은 만년필처럼, 언제나 녹지 않는 몽블랑의 만년설처럼 당신을 사랑할게요!’
때로 추억을 글로 남기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나중에 시간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볼 수 있어서다. 그리고 가슴으로 기억하고픈 인생의 사연들이 우리네 역사가 되어서다.

인생은 정거장이다
주말이면 산에 오른다. 같은 산에 자주 오르니 모습이 익숙한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손을 꼭 잡고 산에 오르는 중년 부부의 모습은 결국 인간한테 남는 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한 양산으로 몸을 덮은 채 산에 오르는 한 여인으로부터는 산이 그녀의 정원처럼 느껴져 웃음이 나온다. 저들의 행동 역시 추억의 한 장이 되고 있다.
막 붉은 나뭇잎 한 개가 살랑거리면서 눈을 스쳐 내려간다. 계절은 가고 또 오고, 눈으로 들어오는 바뀐 세상의 빛깔이 감동을 준다. 결국 계절은 섭리에 따라 가고오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조종한다.
그러니 향내 나는 삶이 각자가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여권에 자꾸 추억의 도장이 찍히는 것도 각자의 몫이 된다. 이어폰이 전해준 노래는 사랑보다 인생을 논해야 더 찰진 맛이 난다는 것을 느낀다.
요즘, 스마트폰 한 개로 인해 세상 빛은 생각의 활동을 덮어버리고, 자꾸만 날카로운 안테나 감각만 요동치게 한다. 인생은 겉돌지 않아야 함을 사람들은 망각한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워졌다. 사람은 당연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 바람은 얼굴 한 번 스치고 사라진다는 것, 계절은 이내 바뀐다는 것, 삶은 역시 녹록치 않다는 것까지. 그래서 자신한테 자주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인생은 정거장이다. 이제 몇 정거장이 남았을지, 그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다. 지금 힘이 든다면 “네가 이겼다!”라고 외쳐보라. 욕심을 내려놓듯 마음이 편해진다. 비로소 삶이 승리에 도취되어 마음에 공백이 생긴다. 그 방심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그 공백의 공간에 바로 추억을 쏟아부어라. 예전에 ‘신과 함께-인과 연’을 볼 때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다.
“인간 세계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는 거다.”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러면 풀릴 거야. 사람도, 세상도, 이 우주도.”
인생의 매듭은 풀리라고 있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듯 살아가면 인생의 상실감은 회복되고, 삶의 허무는 추억의 햇살이 비춰질 것이다. 사람의 삶은 아름다울 때나 많이 아플 때나 ‘나의 편’이 있다면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아픔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편이 있어야 인생은, 자주가 아니더라도 가끔 찬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편이 되어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만들지 않더라도 추억만큼은 영원히,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추억은 인생에서 후회의 크기를 줄여 줄 것이다.
글 김성용 언론학 박사, 현대오일뱅크 전 홍보팀장